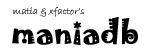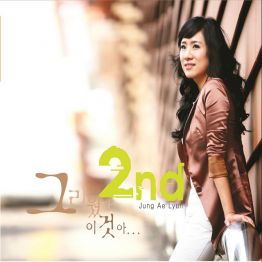정애련은 어떤 공식에 묶이지 않고 근원적으로 인생을 고민하고 논하는 작곡가다. 하나는 스스로와 맞선 내적 자기를 향해, 다른 하나는 작품을 향수할 청중 앞에 설 외적 자기, 이 두 자기가 진짜라는 화두를 놓고 완벽한 진실을 꺼내 표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작품의 구성이고 음악의 세계다. 허다한 학설과, 대강 느끼고 경험한 것을 아는 척, 간접 경험을 끌어다 연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세상이지만, 정애련은 직접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느끼고 진짜로 터득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신의 피와, 땀이 흘러야 하고 작곡가의 체온과 감정이 그곳에 통하지 않으면 창작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치열함이 그의 작품에는 있다. 이 진실성은 그의 작품에 피가 흐르는 피부와 살아서 반응하는 감각을 가진 생명을 주었다.
정애련의 작품은 이 때문에 향수자(享受者)의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다. 상식적인 작곡의 룰을 지키고 가는가 싶으면 비틀고 파고드는 다양한 변칙화성이 너무 자유자재로워 쉬운 듯 화려하고 마술처럼 어렵다. 정애련은 자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물었고, 가슴앓이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얻어냈다. 이 때문에 세상의 고민이 반사한 각도와 크기를 따라 그의 작품의 색깔들은 거침없이 채색됐다. 첫 창작집 <나의 13월>이 그랬다. 한 작품도 비슷하지 않고, 현대의 작품궤도를 따라가지 않았다. 현대인가 싶으면 낭만으로, 그런가하면 급격한 전위로 그는 다양한 화성을 마술처럼 사용하며 인생과 우리 음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고뇌의 끝에서 건져낸 답을 노래에 법문처럼 담아냈다.
그의 작품은 재주로 재현이 되지가 않는다. 그의 작품을 연주하려면 연주자가 그 인생에 가야하고 그 만큼의 음악적 고민을 해야 표현해낼 수 있다. 가식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 진실한 언어와 마음이 그대로 작품에 담겨있어서 그렇다. 이것이 정애련 작품의 특징이다. 따라서 굳이 정애련은 설명이 필요치 않는 작곡가다. 뜨겁고 진하다는 것은 손 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뜨겁고 진하게 인생 그 깊은 곳을 그리고 있다. 정애련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철학자 같은 작곡가다.
한국음악비평가협회 이 일
2009년 6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