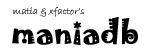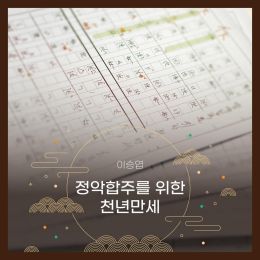본 '정악합주를 위한 천년만세'는 원곡에서 그 구성음과 중심음을 변화시켜 편곡한 악곡이다. 즉, 본인의 음계 구분법으로는 중려순조(계면가락도드리)인 곡을 임종순조로 변화시킨 음악이다.
이러한 음계 구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국악 음계를 설명하는 사람마다 해석 방법이 다르고, 기존의 계면, 우조, 평조라는 명칭은 뜻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에 청자의 입장에선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본 '정악합주를 위한 천년만세'는 대규모 합주곡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였다.
대금은 원곡의 저취사용에서 평취 이상을 주로 사용하고,
피리는 향피리를 쓰며, 거문고는 낮은괘를 위주로 사용하고 해금의 1지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장구의 채편 변화와 집박, 아쟁을 추가하여 대규모 합주곡의 쓰임에 맞도록 했다.
단, 가야금은 다른 악기와 마찬가지로 편곡 악보와 음계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 녹음 당일 가야금 주자가 임의로 조율만 내려 원곡의 악보와 연주법 그대로 연주하였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가야금 편곡 내용은 시간과 비용 문제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본인의 편곡 방법은 국악 음계의 체계화와 음악적 고민에서 나타나는 아이디어가 주인 관계로 각 국악기의 세세한 부분을 터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정악합주를 위한 천년만세'의 각 악기 주자들은 연주자임과 동시에 본인 악기의 편곡자 이다.
특히 계면가락 도드리에서 양청도드리로 넘어가는 부분의 장단 바뀜은 기존의 '반각', '향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구 주자인 안성일 선생님의 제안으로 녹음 당일 바뀐 부분이다.
또한 아쟁은 '정악합주를 위한 천년만세1'(계면-양청-우조가락도드리)에 모두 활대를 사용하는데, 짧은 천년만세(정악합주를 위한 천년만세2)에서는 아쟁 선생님의 음악적 견해에 따라 양청도드리에서 활대를 쓰지 않고 줄을 뜯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소금은 모든 합주 녹음이 끝난 후에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본인이 따로 음원을 들으며 녹음하였다.
끝으로 제대로 된 사례를 드리지 못함에도 흔쾌히 녹음을 도와주신 모든 연주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가야금: 박나영
거문고: 김민주
대금: 박장원
소금: 이승엽
아쟁: 김수진
장구: 안성일
집박: 최성호
피리: 이민하
해금: 문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