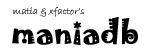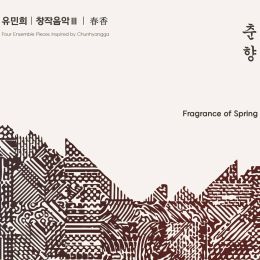한국음악 작곡가로 세 번째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장단, 선율, 악기주법등을 활용하기 위해 전통음악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춘향가는 저와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 음반은 판소리 춘향가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네 개의 기악곡을 수록하였습니다. 춘향가의 가사에서 진한 영감을 얻어 시작된 곡도 있고, 춘향가의 선율이 부분적으로 차용된 곡도 있습니다.
<유민희 창작음악Ⅰ-Song of Life>를 발매하며, ‘한국음악 작곡가라고 불리우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이 현재까지도 지적 감탄과 예술적 감동을 준다는 것을 느끼며 작곡하는 일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저의 음악을 들으며 공감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RACK LIST
1.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네가 알려무나> 10:01
2. 12현 대아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 17:19
3. 해금 · 가야금 Duo <돋는 달 드는 해> 10:26
4. Ajaeng Quartet <보고지고보고지고> 12:21
작품소개
1.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네가 알려무나>
작곡 유민희 / 대금 정소희 / 피아노 신은경
박봉술제 춘향가 중 <긴 사랑가>에서 이도령은 춘향을 안고 진양장단의 긴 호흡으로 자신의 사랑을 웅장하게 노래한다. 이도령은 춘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는데, 이 노래의 말미에서 제목을 따왔다.
동정칠백월하초(洞庭七百月下初)에 무산(巫山)같이 높은 사랑
목란무변(目斷無邊) 수여천(水如天)에 창해(滄海)같이 깊은 사랑
생전사랑 이러헐 적에 사후 기약이 없을소냐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야
네 꽃송이를 내가 덥벅 물고 너울너울 넘놀거든
날인 줄로만 네가 알려무나.
너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나는 죽어서 인경마치가 되어
저녁이면 이십팔수 새벽이며는 삼십삼천
그저 뎅,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인경소리로 들리어도
우리 둘이 듣기에는 내 사랑 뎅 이도령 뎅 날마다 치거들랑
날인 줄로만 네가 알려무나.
흔들림 없이 꿋꿋하고 우직한 우조의 선율이 가진 서정적 표현에 이도령의 마음이 더 애절하게 다가와 새로운 곡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고, 대금과 피아노로 그 심상을 표현하였다.
2. 12현 대아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
작곡 유민희 / 12현 대아쟁 이신애 / 징 우민영
김소희 명창이 부르는 <춘향가> ‘오리정이별’ 대목을 인상 깊게 듣고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다. 작곡을 시작하면서 이 대목의 사설을 읽다가 춘향의 우는 모습을 확인하고 온 방자가 이도령에게 “춘향이가 우는디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겄습디다” 라고 전하는 부분에서, 이별을 맞이하는 춘향이의 슬픔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이 곡은 제삼자의 관점에서 춘향의 슬픔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개된다.
춘향은 이도령과의 이별을 만류하기 위해 울어도 보고 억지도 부려보지만, 당시 이도령은 춘향의 바람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결국 춘향은 이별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도령을 보내기 위해 오리정까지 따라온 춘향의 이야기는 이렇다.
‘그 때여 춘향이난 따라갈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서서 이마위에 손을 얹고 도련님 가시는기만 뭇두두루미 바라보니, 가는대로 적게 뵌다.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고개 넘어 아주 깜박 넘어가니, 그림자도 못 보것네...’
춘향에게 이도령은,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먼지만큼 티끌만큼 보이다가” 끝내 흔적도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린 존재다. 나는 이 대목을 거듭 들으면서, 춘향의 복잡한 심사를 생각했다. 이별의 슬픔, 사라져가는 이도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모든 작아지는 것들에 대한 사랑. 내가 느낀 이런 정서를 대아쟁 선율에 얹어서 작곡했다. 이 곡의 제목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는 <춘향가> 사설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가”에서 가져왔다.
3. 해금 · 가야금 Duo <돋는 달 드는 해>
작곡 유민희 / 25현 가야금 서은영 / 해금 조혜령
이 곡은 춘향가 中 ‘농부가’의 선율을 차용한 곡이다. ‘농부가’는 일하는 농부들의
노래이다. 장원급제한 이도령이 춘향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남원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농부들의 노래를 듣는다. 어렵고 힘든 시간은 뒤로 하고, 만남과 희망을 기대하는 두 사람의 그리움을 담아내려고 했다. 만정제 춘향가 중 농부가의 사설에 “돋는 달 드는 해’를 벗님의 등에 싣고, 향기로운 이내 땅에 우리의 보배를 가꾸어 보세”의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하였다. 같은 내용의 사설이 김세종제 농부가에서는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솟아온다.”로 되어있다. 만정제 사설에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결하면서도 곡진하게 표현되어 곡의 제목으로 삼고, 이도령과 춘향이 만날 시간의 흐름과 곡의 흐름은 해금과 가야금의 선율로 그려냈다.
4. Ajaeng Quartet <보고지고보고지고>
작곡 유민희 / 소아쟁Ⅰ 배문경 / 소아쟁Ⅱ 이화연
대아쟁Ⅰ 김참다운 / 대아쟁Ⅱ 최혜림
이 노랫말은 <춘향가>의 두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도령은 광한루에서 춘향을 처음 본 다음, 밤에 만날 약속을 하고, 오후 내내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린다. 춘향을 만나는 기다림의 노래가 ‘천자뒷풀이’인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춘향 생각을 “춘향과 날과 서로 마주 앉어 입을 대고 정담을 허면 법중 여(呂)자가 아니냐”라고 노래하고는 춘향에 대한 저돌적 기다림을,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춘향 보고지고”라고 크게 외쳐 동동거리는 마음을 표현한다. 광한루에서 처음 만난 춘향을 비로소 만나려 가는 저녁, 설레는 청년의 마음이 노랫말속에 드러난다.
다른 한 부분은 옥중에 갇힌 춘향이 부르는 ‘쑥대머리’에서 춘향의 독백으로 이 사설이 나타난다. 춘향은 헝클어진 머리인 채로, 한양으로 올라간 이도령을 그리워하며,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라고 노래한다. 고통 속에서도 이도령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고지고보고지고”라고 표현하는 서로 다른 상황의 두 구절을 화두로 삼아, 춘향과 이도령 사이의 사랑과 이별, 탄식과 옥중 재회까지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악곡의 중간중간에 ‘천자뒤풀이’, ‘사랑가’, ‘쑥대머리’ 선율의 일부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