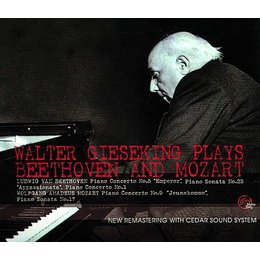시골뜨기 청년 베토벤이 빈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가 주목을 끌었던 것은 작곡가로서가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서 였다. ‘누구도 겨루기 어려운 피아노의 명인’이라는 명성을 쌓아가면서 그는 자신의 작품도 연주하기 시작했고, 의외성의 신선한 충격으로 가득찬 그의 작품은 빈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피아노 협주곡 C장조는 그가 두 번째로 작곡한 협주곡이다. 그런데도 1번으로 되어 있는 까닭은 최초로 작곡했던 B플랫 장조협주곡(제2번)보다 C장조 협주곡이 먼저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는 로코코적인 주제로 시작되어 이 작품의 미묘한 맛을 형성하고 있는데, 젊은 베토벤의 패기만만한 면모가 참으로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세도막 형식을 취한 2악장 라르고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주제를 피아노가 제시하는 첫 부분, 독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환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둘째 부분, 그리고 첫 부분이 리듬을 약간 달리하면서 재현되는 셋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쾌하게 전개되는 3악장 론도는 설익은 듯 하면서도 싱싱한 리듬이 특징을 이룬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op.73 ‘황제’
이 협주곡은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나폴레옹군(軍)의 포성이 빈 근교에서 요란하게 작열하고 있는 동안 작곡되었다. 베토벤은 포성을 듣지 않기 위해 벼개로 머리를 둘러쓰고 신음하기도 했고, 소리로 소리를 상쇄하기 위해서 발광한 듯이 목청껏 절규하기도 했다. 그 때의 정황을 그는 “북과 대포 소리, 군인과 온갖 비참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협주곡은 나폴레옹군의 말발굽이 불러 일으키는 전진(戰塵)과 포성의 아우성에 대한 베토벤의 격렬한 항변이 불꽃을 튀긴다. 그것은 난무하는 포탄에 대한 베토벤의 비장한 음악적 반격이다.
이 협주곡이 너무나 당당해서 누군가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었고, 출판될 때도 그 이름이 그대로 간직되어 지금도 ‘황제 협주곡’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교향적 협주곡’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웅대한 구도가 협주곡이라기 보다는 교향곡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1악장 알레그로는 전 관현악의 강력한 코드로 유도된 세 개의 불기둥이 3화음을 이루면서 처절하게 치솟고, 그 때마다 피아노는 격정적이고 불똧 튀는 카덴자를 연주한다. 그것은 참으로 장엄한 서사시의 밀도 높은 드라마이다.
너무나 엄청난 힘으로 폭발하는 에너지의 분출이 숨막히게 몰아치는 1악장과는 달리, 극히 명상적인 아다지오의 2악장은 베토벤이 평화로운 세계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었던가를 표출하고 있다.
거센 힘이 제동기능을 상실한 듯이 범람하던 1악장에서 벼란간 그지없이 평화로운 세계로 침잠하는 그 변모에 충격을 받게 되지만, 그 맑고 아름다운 세계야말로 베토벤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메어질 듯 벅찬 감동을 맛보게 된다.
피날레 악장에서 베토벤은 종종 온 세계의 윤무(輪舞)를 꿈꾼다. 그러나 일탈하는 사람들, 드높음으로부터 아득히 먼 곳에서 딩굴고 있는 사람들조차 포용해야 하는 그 윤무는 이따금 조잡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테제와 안티테제가 부딛혀 쉽사리 용해될 수 없는 채 한 동안 갈등이 계속되는 마지막 악장은 그에게 언제나 혼란이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드높음을 상실한 채 잠시 비틀거리던 알바트로스는 마침내 다시금 비상을 시도한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날개로 시도되는 그 비상은 언제나 숭고하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op.57 '열정‘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나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에드빈 피셔는 ‘소나타 예술의 정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빌헬름 캠프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지상적(地上的)인 힘의 영원한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리츨러는 “냉정을 잃지 않고 들을 때면 이 작품 속의 거칠게 날뛰는 패시지에서도 희열을, 그리고 동요하는 선율 속에서도 그것을 억누르는 통제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리츨러는 이 작품이 결코 격정의 폭발로만 시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베토벤의 작품 표제 거의 모두 그렇듯이 이 소나타에 ‘열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베토벤 자신이 아니라 출판업자 크란츠였다. 그러므로 ‘비창’ 소나타를 구석 구석 비감으로 채우고, ‘열정’ 소나타를 격정이 넘치게 하며 ‘월광’ 소나타를 시종, 달빛 어린 풍경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생각이다.
‘열정’ 소나타는 1804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썼던 2년 후에 착수되어 그 이듬 해에 완성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거의 아무 것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청각이 악화되었던 시기의 작품이다. “들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고통은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귀의 악화란 청각장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서에도 적혀 있듯이 견딜 수 없는 통증, 머리가 터질 듯이 쑤시는 가혹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베토벤의 삶은 ‘부당한 운명의 가혹함’, 그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과의 처절한 투쟁의 나날이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그 참담한 고통 속에서 영그러진 열매였다.
첫 악장의 첫 주제는 격정의 불길을 깊숙한 곳에 내장한 채 그 지각(地殼)의 심연에서 울려 온 아득한 파장처럼 미세한 진동으로 꿈틀거린다. 형채없는 불안 속의 서성거림을 헤치고 좀 더 확신에 찬 두번째 테마가 등장하면서 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