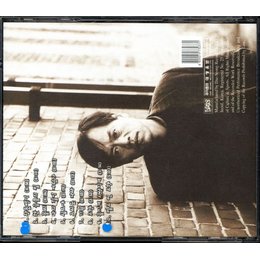(김학민은 음반제작도 했었고 작사, 작곡, 편곡도 하고 술도 마시고 환상에 젖기도 하는 인간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강한 의리라 말할 수 있다.)
- 학민아, 이거 이상하다.
- 뭐가 ?
- 니가 일본 오라고해서 왔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 너, 어차피 미국에 갈 거 아냐 ?
- 그래 너 때문에 들른거야, 니가 오라고 했잖아. 미국 가는 길에 들렀다 가라고
- 그랬지, 난 니가 도쿄에 와서 한 잔 사고 미국 갈 줄 알았지
- 내가 ?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요즘 거지야, 나
- 그래 ? 몰랐어.....
나는 잠시 고민에 빠지고 있었다. 그냥 미국으로 가야했는데 일이 꼬이고 있었다. 잠시 후 학민은 커피 먹은 계산서를 들고 일어서고 있었다.
- 가자.
- 어딜 ?
- 내가 불렀으니 일본에서 며칠 놀다가.
나는 안도의 숨을 내 쉬었고 학민이 이끄는 대로 도쿄 근처의 작고 촉촉한 도시에서 여러 날을 묵으며 추억 같은 날들을 맛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맥주와 가라오케를 즐기다 밤이 이슥해서 맥시코인이 경영하는 술집을 거쳐 한국인 주점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겨울이었고 추웠다.
나는 차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눈에 불빛이 들어왔다.
굉장히 강렬한 써치라이트였다. 마치 공중으로 습격해오는 적기를 발견하기 위한 불빛처럼 그 빛은 밤하늘을 부지런히 핥고 있었다.
- 저게 뭐지 ? 저 불빛 말야,
- 아, 저거 호텔 불빛인데, 사람이 꽉 차면 불빛이 꺼지고 아직 빈방이 있으면 불빛은 밤새도록 비치는거야, 일종의 삐끼 역활을 하는거지.
나는 호텔 주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2. 그로부터 5년 후, 1999년 가을 나는 곽성삼의 전화를 받았다.
음반을 낸다는 것이었다. 나는 녹음실도 쫓아다녔고, 여의도의 작은 공원에서 종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그의 노랫말들이 쓰여있는 악보를 보았고, 그의 사랑과 인생과 생명력을 새삼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유원,보일러공,외판원 등의 수입으로 살았던 그의 지난 몇 년간의 방황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곽성삼은 노래를 한다.
"참새를 태운 잠수함"의 주전 가수였고, 찬송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악 가요적인 노래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 "물레"는 참 좋았고, 본인의 독집도 이미 2장이나 나와있고, 언더그라운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전설적인 아티스트 곽성삼이 새 음반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3. 나는 곽성삼과 곽성삼의 새 음반이 마치 일본에서 보았던 작은 호텔 같았다.
그 호텔에서 밤하늘을 향해 쏘아대던, 아니 작은 따스한 방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들의 영혼을 손짓하던 그 불빛이라고 느꼈다.
느닷없는 연결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일본의 작은 호텔의 불빛과 곽성삼의 음악, 그의 노래들이 나의 어둠을 씻어내 주길 기대하는 중이다.
곽성삼 그는 작은 호텔이다. 어둠을 향해 빛을 쏘아대는...
글 : 구자형(한국음악과학연구소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