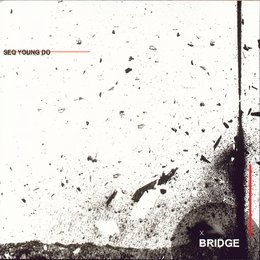지난 2007년 12월, 대한민국 재즈사에 작은 사건으로 기록될 공연이 있었다―현재 우리 재즈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급의 젊은 음악인들이 ‘SMFM(Seoul Meeting Free Music)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치열하고도 적나라한 자유즉흥연주를 펼친 것. 적지 않은 음악인들이 “일반 대중들도 재즈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그 공연의 막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의미를 찾을 수 있긴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연주자들이 가슴 속에 숨기고 있던 ‘야성과 분노’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베이시스트 서영도가 있었다. 솔직히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한결 거칠고 공격적이며 주관적인 음악이었다. 하지만 서영도는 베이시스트의 기본적인 역할을 끝내 고수했으며 연주가 진행되는 도중 자못 많은 상념을 떠올리고 있는 듯했다. 무엇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았을까. 그로부터 반년의 세월이 흘렀고, 새 앨범 소식과 함께 문득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2006년에 발표된 서영도의 첫 리더작 [Circle]은 그 해 우리 재즈계가 건진 최고의 수확 중 하나였다. 10여 년간의 무명 아닌 무명활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 작품을 향해 음악계는 의심의 여지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영도는 얼마나 큰 중압감을 안게 됐을까. 많은 이들은 진작부터 다음 작품을 기대했으며, 우연히 그와 마주칠 때마다 나 역시 같은 얘길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의 새 앨범을 마주하고 있노라니, 서영도는 이미 [Circle]에 대한 추억과 단상을 철저히 과거의 것으로 묻어버린 지 오래였다. 사실 [Circle]은 스펙트럼이 꽤 넓은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그 다양한 색채의 조화가 워낙 뛰어났기에 우리는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던 게 아닌가. 이제 서영도가 새롭게 내놓은 [Bridge]는 그가 선보였던 넓은 스펙트럼에서 하나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택해 밀도 높은 조명을 가한, 고집스럽고 통렬한 작품이다.
함께한 음악인들의 면면에서, 혹은 편성에서 [Bridge]는 크게 둘로 나뉜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의 벗들과 연주한 ‘Manager Craig’와 ‘Insomnia’, 그리고 ‘Miles' Corner’가 있다. 나머지 네 곡에서는 이주한, 손성제, 정수욱, 송영주, 배장은, 김윤선(Sunny Kim), 이상민, 박주원, 김호윤 등 여러 동료들이 가세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작품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것은 바로 앨범 구성이다. 이는 서영도가 전작인 [Circle]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인데, 이번에도 전체적인 구성을 살피는 것이 [Bridge]의 지향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뛰어난 작곡이 돋보이는 ‘Insomnia’는 서영도가 전하려는 주제의식을 포괄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Circle]과 [Bridge]가 일부 맥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케 하며, 곡 전면에 흐르는 냉랭한 멜로디와 진행은 앨범 전체가 만만찮은 정서로 가득했음을 기대하게 한다. 서영도의 창작의도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1970년대 초를 기억하는가. 재즈 팬들은 1969년에 녹음된 재즈 록 퓨전의 걸작 [In a Silent Way]와 [Bitches Brew]만으로 그의 당시 음악을 규정하는 경향이 짙지만, 시각에 따라선 이 또한 완성품이 아닌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1970년에 녹음된 [A Tribute to Jack Johnson]과 1972년에 녹음된 [On the Corner]를 제쳐두고 1970년대의 마일즈 데이비스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다. 서영도가 새롭게 관찰한 것이 바로 이 음악이다. 앨범의 구성상 서두에 실린 곡들이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실제로 그 다음에 이어진 곡들은 [Bridge]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떠안았다. 세태를 생각해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의 퓨전 곡이 배치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공연 실황으로 녹음된 ‘The Music of Chance’와 [On the Corner]에 영향 받은 ‘Miles' Corner’를 등장시키며 급기야 서영도는 묵직하고 얼얼한 펀치를 한 방 날린다.
그렇다면, 36년 전에 녹음된 과거의 음악을 다시 들춰낸 것이 과연 타당할까 의문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 음악인의 의지와 듣는 이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지만, 만약 [Bridge]가 마일즈 데이비스를 향한 서영도의 오마주에 불과하다면 그 독창적 가치는 반감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서영도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을 재현하려는데 뜻을 두지 않았다. 옛 거장의 발자취를 짚어낸 것이 [Bridge]의 단초를 제공했건만, 그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침없고 시니컬한 야유의 제언을 던지며 정면 돌파를 꾀했다. 이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의 객체가 아닌 주체다. 따지고 보면 이처럼 주관적이면서도 묘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만나는 것이 현재 우리 재즈계의 흐름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의 앨범이 음악의 집약체이기에 앞서 상품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상기하라. 서영도의 고집스런 행보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폴 오스터의 소설 「우연의 음악(The Music of Chance)」에서 제목을 딴 ‘The Music of Chance’가 의도된 혼란을 야기하며 앨범의 본론에 진입한다면, 작은 모티프만을 바탕으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일종의 자유즉흥연주를 벌인 ‘Blackout’과 ‘Sonicedge’는 의 가치와 매력을 응축시킨 세션이다. 참여한 연주자들의 개성이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스타일을 비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흥밋거리다. 송영주의 피아노와 배장은의 건반이 엇갈리며 빚어내는 음색의 대비는 어떠하며, 손성제의 색소폰과 이주한의 트럼펫이 제시하는 팽팽한 긴장은 어떠한가. 곡에 따라 두 명, 혹은 세 명의 기타리스트가 등장하는데, 모두 다른 음악적 지향을 지녔음에도 공통적으로 연출한 거친 톤과 프레이징은 디렉터로 나선 서영도의 의도에 잘 부합한다.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김윤선의 보컬과 자신감 있게 비트를 이끌어가는 이상민의 드럼 또한 인상적이다.
‘Blackout’과 ‘Sonicedge’의 성과는 특기할 부분이 많다. 그동안 앨범을 통해 만났던 우리 음악인들의 연주는 대부분 특정한 의도에 따라 전개된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이 두 곡의 시도는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참신했다. 서두에 언급했던 ‘SMFM 오케스트라’의 경험이 좋은 자산으로 작용한 듯한데, 함께한 연주자들이 그러한 서영도의 지향을 잘 이해한 것도 다행스러웠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감추고 싶지 않다. 10여 분 동안 연주된 이 두 곡에 각각 3분 정도의 시간을 추가해 솔로이스트들의 보다 적극적인 연주를 이끌어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쉬움으로 남지는 않는다. 이미 서영도가 드러낸 지향은 충분히 어필됐기 때문이다. 끝 곡으로 실린 발라드 ‘Pray’는 피아노와 베이스의 듀오로 녹음됐지만, 전방위적으로 펼쳐낸 작품 전체의 정서를 말끔히,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다. 이 곡이 없었다면 앨범 구성의 묘미는 한결 덜했을 게다.
이제 서영도는 두 장의 앨범을 통해 그만의 작가주의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단순한 독창성의 언급을 넘어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음악과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이 비교적 명료하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채 눈빛을 고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는 [Circle]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Bridge]가 드러낸 정서 속에 다분히 중간자적인 면모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일견 뜨거운 열정으로 보이다가도 그 본질은 냉소에 가깝다는 인상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무릇 절제와 억압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절제가 능동적이라면 억압은 피동적이고, 억압이 독창성을 저해한다면 절제는 이를 배가시킨다. 재즈에서 얘기되는 절제란 특정한 가치에 의해 제어된 사전적 의미의 그것이 결코 아니다. 발산의 욕구가 엿보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이를 조율하는, 역설과 이중성의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 [Bridge]의 이면에 바로 이러한 미덕이 드리워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각인된 서영도의 모습은 ‘믿음직한 베이시스트’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리고 그의 연주에 대해 사람들은 상투적으로 몇몇 역사 속 명인들을 얘기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새 앨범 [Bridge]를 통해 드러난 서영도의 연주는 마일즈 데이비스가 1970년대 초에 기용했던 마이클 헨더슨에 가깝다. 비록 1970년대 중반 들어 노래 부르기에 집착함으로써 더 이상 재즈 팬들에게 추억되지 못했으나, 그의 베이스 연주는 분명 특별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특유의 육중한 그루브가 빠지면 밴드의 음악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마이클 헨더슨은 그런 음악인이었다. 서영도에게서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은, [Bridge]가 몇몇 연주자들의 재기발랄함에 좌우되지 않고, 연주 전체를 관장하는 디렉터의 직관과 역량으로 완성됐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 재즈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큰 축으로 발돋움할 것이란 믿음이 그래서 가능하다.
재작년, 서영도의 [Circle]과 함께 그 해 여름을 보냈다. 이제 그의 새 앨범이 2008년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심상찮은 여름을 예견케 한다. 말 그대로 나이 마흔, ‘세파에 혹하지 않음’의 가치와 의미가 이 작품 속에 절절히 녹아 있다. 서영도, 아름다운 야성의 불혹이여.
김 현 준 (재즈비평가. EBS SPACE “공감” 기획위원, 월간 재즈피플 편집위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자료제공: 강앤뮤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