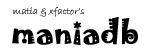동학창작탈굿 [눈자라기]는 일반적인 뮤지컬이나 음악극과 달리, 극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노래하지 않고, 각 장면의 이미지 또는 분위기를 나타낸다든지 극 중 상황이나 캐릭터의 정서적 표현 등을 주로 노래하면서,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탈춤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노래들은 극의 줄거리와 관계없이, 노래 자체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 담긴 풍부한 상징과 환타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펼쳐낸 동학창작탈굿 [눈자라기]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검결], [백산] 등과 같은 민속적인 노래와 가사들, [꽃을 사랑한 호랭이], [소나기], [홍동지]와 같은 재미있는 캐릭터의 놀이 노래들과 도종환 시인의 시에 노래를 붙인 [담쟁이] 등 여러 가지 소재와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들이 절묘한 크로스 오버 사운드에 실려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눈자라기] 작품 해설
19세기 중엽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봉건적 착취와 압박,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하늘’이라고 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은 아직도 “눈자라기”(아직 곧추 앉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우리말)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나아졌음에도 우리의 의식은 19세기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니 그보다 못하다.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만, 실상은 비열함과 나약함 속에 안주하며 우리가 아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눈자라기”가 아닌 누리망(지상, 세계라는 누리와 그물, 망태기의 망을 섞은 순수한 우리말의 혼합어)이 되기를 희망한다.
[눈자라기] 작품 줄거리
옛날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보은에는 “우는 나무”가 있었다. 언제나 큰 일이 있을 때면 나무는 울음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 사람들은 그런 나무의 울음소리에 미리 미리 대비하며 서로서로 위하고 나누며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그렇게 21세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나무의 울음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무는 울 수 없고 무엇인가 예견해 줄 수 없는 식물에 불과하단다. 그러던 나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 아이가 찾아왔다. 아이는 상처를 안고 떠돌다 나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 아이에게 나무는 하나 하나의 빛을 통해 사람들이 안고 왔던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나아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빛이 된다. 지금도 아이는 세상 곳곳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빛으로 남고, 보은의 우는 나무는 홀씨 되어 아이의 뒤를 따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