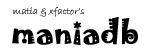예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정화수 한 그릇 천지신명께 바쳐놓고 늘 가족을 위해 소박한 치성을 드렸다. "우리 귀한 가족 걸음마다 꽃이 피고 말끝마다 향기 나게 하소서. 그저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 만나아 가게 하소서." 세상사람 모두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자애로운 사랑과 간절한 기원을 소리로 옮겨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더 키우고 넓혀 신산한 삶의 무게를 버거워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치성을 드리고 싶었다. "비손"과 "바라지축원"에서 우리는 소리로 치성을 드렸고, "씻김시나위"와 "무취타", "만선"에서 우리의 치성은 불고 뜯고 두드리는 연주 속에 담겨있다. 보듬어 챙기고 따뜻이 감싸는 사람의 길을 위한 바라지의 음악 치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 비손(Beasohn, Song of Prayer) 작곡_한승석
모두 잠든 첫 새벽, 홀로 잠에서 깨어 첫 우물물 길어다 소반 위에 올려 놓고 가족의 안녕을 빌던 우리 어머니들의 소박한 의식이 있었다. 손을 비비며 읊조린다 하여 '비손'이라 부르던 전통의례이다. '바라지'의 "비손"은 이러한 어머니들의 기원과 전통 비나리의 노랫말을 활용하여 남도소리제로 새로 짠 작품이다. 반복되는 후렴구 "상봉길경 불봉만재 만재수 발원相逢吉慶不逢萬災滿財數發願"은 " 길하고 경사스런 일만 만나고 온갖 재난은 비껴가며 재수 좋은 일만 가득 하소서" 라는 의미로 평온과 풍요의 삶을 기원하는 이 곡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2. 씻김시나위(Ssitgim Sinawi, Instrumental Ensemble for the Departed) 작곡_한승석, 바라지
"씻김시나위"는 진도 씻김굿의 소리와 반주 음악을 재료로 하여 작곡된 기악합주곡이다. 망자의 서러움을 대신 울어주고 넋을 씻어 천도하는 씻김굿의 음악은 아프고 처량하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닌 이동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러니 슬퍼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진도사람들의 생사관 때문일까. 씻김굿의 음악은 때로 밝고 신이 난다. '바라지'의 "씻김시나위"또한 슬픔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지만 비감한 가락은 자주 들썩이는 신명으로 변주된다. 삶은 계속되고 슬픔이 우리를 절망과 멈춤 속에 가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씻김굿 중 안당, 고풀이, 이슬털이, 넋풀이 등의 음악이 이 곡의 바탕에 있다.
3. 무취타(Muchuita, Shamanistic Percussion with the Wind) 작곡_한승석, 바라지
한량없이 기쁘다가도 일순간에 노여움이 일고, 분노가 쌓여 깊어진 설움도 한 바탕 울음으로 날려버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무속가락으로 불고 친다'는 의미의 "무취타巫吹打"는 이렇듯 사람이 살면서 늘 부대끼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네 가지 감정을 타악과 태평소를 주된 수단으로 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경기와 진도지방의 무속장단을 활용하여 작곡하였고 모두4악장으로구성되어있다. 1악장희喜는부정놀이와당악을, 2악장노怒는올림채와마음조시, 겹마치를 이용하여 표현했으며, 3악장애哀와4악장락樂은도살풀이, 흘림, 배다리, 진도푸너리 장단 속에 녹여보았다.
4. 바라지축원(Baraji Chugwon, THE BARAJI’s Wishes for You All) 편곡_한승석
진도씻김굿 중 제석굿은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사람을 위한 거리다. 제석신의 유래는 고대 인도의 신 인드라Indra로, 인드라가 불교의 호법신 제석천이 되고, 이 제석천이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으로 유입되어 수명과 곡물, 번영을 주관하는 신으로 받들어졌다 고한다. "바라지축원"은 제석굿 중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원의 내용을 추출하여 소리로 다시 짜고 무의식巫儀式과 춤을 적절히 배치한 작품이다. 특히 메인보컬의 소리를 받치면서 흥취를 돋우는 악기연주자들의 바라지 소리가 돋보이며, 팀이 추구하는 음악양식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다.
5. 만선(Mahnsun, Song of a Full Boat) 편곡_한승석
"만선"은 전라남도의 섬 거문도에서 불리는 뱃노래에 타악을 결합하여 풍어의 기쁨을 표현한 곡이다. 왁자지껄한 출어의 현장과 그물을 올리는 과정, 고기를 가득 싣고 만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과정이 타악과 소리, 태평소 선율 속에 활기차게 그려져 있다. 노 젓는 소리, 올래 소리, 썰 소리, 어영차 소리를 중심으로 노동요 특유의 메기고 받는 구조는 살리되 사설과 장단을 압축하고, 여기에 진도풍물가락, 임실필봉 가락 등을 더해 음악적 확장을 꾀했다. 풍성한 타악과 소리의 울림 속에서 대동세상을 지향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느낄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