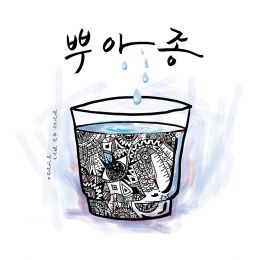명료하고도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었다. 청춘의 아름다움과 실연의 상처는 유니버셜이니까.
이 글을 본 두 명의 음악인은 같은 가사로 자기만의 곡조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만약 세 명이었다면 세 곡의 ‘청춘’이 나왔겠지.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작업이다.
곡을 만드는 과정은 즐거웠다. 서로 다른 멜로디를 들으면서 각자의 색깔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 메모 하나가 만드는 신기한 광경에 또 다른 이도 용기를 냈다.
“이것도 가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태진 것이 ‘빅토르 최’이다. ‘청춘’을 듣고 빅토르 최를 떠올린 건, 나의 청춘에는 빅토르 최의 음악이 가득했기 때문.
허구한 날 반복되는 드라마처럼 우리들 사연은 거기서 거기겠지. 그렇지만 나만 아는 그 빛깔과 냄새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나만의 것. 우리 노래를 듣게 된 어딘가의 누구에게 말해본다. 이 노래를 듣고서 너만의 노래를 불러주겠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