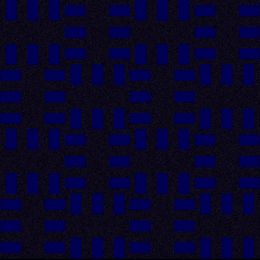아무리 씻어도,
자려고 누우면
머리카락 사이에서 모래가 나온 날들이 정말 많았다.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빛을 보며
‘아 저게 수면인가’ 생각하며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날도 있었다.
보름달 뜨는 밤이면
‘지금 어느 바다엔 물이 가득하겠지’ 떠오르는 생각에 골치 아프기도 했었지.
저런 것도 똑같은 파도라고 불러야 할까 싶던,
방파제에 부숴져, 도로로 넘쳐나던 바닷물을 기억한다.
고작 반 년인데 무섭거나 설레이던 것들은 희미해졌고
설마 설마 싶던 것들이 내 곁에 남았다.
근데 나 수영 못하는 거 알지...
아직 더웠던 어느날 밤.
전부 끝내야지 끝이지, 끝난거지 떠들어대던 무렵의 여름밤.
태어나 처음으로 천국이나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당신과 세 번, 네 번쯤 더 만나는 건 지금 이곳에서이겠지만,
그 다음이 또 있다면 아마 그곳은 지옥이겠지.
엿같은 이 세상.
그 와중에 또 달콤하구나.
누가 누구를 찾아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는 조금은 기다릴지도.
뭐 그런 거.
아니,
바로 그거,
여름밤. ....
 ....
....